아침에 잠시 달리기를 다녀와서 쓴 글입니다.. :)
높임말이 아닌 것은 조금 더 서정성이 있었으면 하는 글쓴이의 바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양해 부탁드려요.
눈이 내리네요.. :) 잠시라도 따뜻한 실내에서 추억할만한 기억 하나 꺼내보시는 여유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1
-
아우디
2012.12.21 15:07
-
:)아우디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새 가장 많이 생각하는 One and only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짧지만 깊은 편린에..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 많은 분들이 위로는 괴로워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평소에도 위로는 필요하고,
위로받았습니다.. ^^
-
클래이
2012.12.21 23:10
음악도좋고 글도좋습니다.....
소고님 편안한밤 되세요^^
-
감사합니다 클래이님.. :) 이제야 봤네요.
행복하고 푸근한 아침 되시길 기원합니다.. ^^
-
많은 생각을 해보는 글입니다.. 마지막 글귀가 머리속을 맴도는군요..
편안한 주말보내세요..^^ 추천 한방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제니스님.. :)
제니스님께서도 편안한 주말 되세요.. :) 남자의 위로는 또 다른 위안이 되는 듯 합니다.. :)
-
멋진데여~~
-
그레골(?)님 :) 감사합니다.. :)
-
소고군에게
눈오는 날 이런 감상에 젖는다면.. 소고군이 차가 없어서 그런 거라네. ^^;
나이가 들고 차가 생긴 후에는 눈오는 날이 전혀 달갑지 않는데 그런 내가 변해버린 거라고 질타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나이가 들고 무언가 가지게 되면 소심해지고, 번명하고, 보잘 것 없는 소유에 대한 박탈을 두려워하게 되겠지...
사실 젊은 시절의 좋은 점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역설이
가장 정확한 변명이라고 생각하네.
젊은 시절 가능성의 시간을 열심히 즐겨 보시게나.
인생을 너무 계획하지 말게나.
예측하지 못한 채 밀어 닥치는 미래의 시간이라는 바람에 갈대의 부드러움이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내가 늘 얘기한
" 인생이 계획대로 되든..."
그리고 빨리 여기 와서 청소라도 좀 하시게.
그런 소고님의 아름다운 영혼을 나는 기꺼이 느껴 보고 싶다네.
-
XD 피쿠스님...... 1월 말부터 개강까지 주욱 상주할 예정입니다. XP
-
아 멋지네요. 저도 혼자 자전거로 투어 하면서 많은 상념들을 머리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 번호 | 섬네일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4 |

|
미국 스키장에 폭설이 왔네요
[24] | Jason456 | 2012.12.28 | 2362 |
| 73 |

|
[스위스] 스노우 보드 타기!
[19] | 공간차이 | 2012.12.27 | 3749 |
| 72 | LA(로스엔젤러스)에 3~4일 정도 출장을 갑니다. [9] | 프리힛팅 | 2012.12.26 | 1920 | |
| » |

| [BGM] 달리기 [11] | 소고 | 2012.12.21 | 1871 |
| 70 |

|
저도 겨울을 실감하고 왔습니다.
[10] | 지옥의화신 | 2012.12.19 | 1723 |
| 69 |

|
스키장 다녀왔습니다.
[22] | 감독님 | 2012.12.18 | 1742 |
| 68 |

|
Prague, Czech
[61] | 반즈 | 2012.12.07 | 2383 |
| 67 |

|
프라하 #1
[39] | Mishkin | 2012.12.07 | 2770 |
| 66 |

|
페루 여행때 찍었습니다
[45] | 루리테일 | 2012.11.30 | 2329 |
| 65 |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나라를 가장 가고 싶으세요?? [48] | 리더스 | 2012.11.23 | 2023 | |
| 64 | 대구 출장가는데요,,,막창집 추천부탁합니다 ^^;; [10] | 짱꾸 | 2012.11.21 | 2028 | |
| 63 | 집으로 가는 길 - 퇴근 [3] | 로부스토 | 2012.11.21 | 1568 | |
| 62 |

|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피렌체 야경
[27] | 645af | 2012.11.18 | 3389 |
| 61 | 부산 호텔 추천바랍니다 [15] | DREWLUV | 2012.11.14 | 2217 | |
| 60 |

|
Dubrovnik in 크로아티아
[11] | choiperman | 2012.11.10 | 1645 |
| 59 |

|
와이프와 3살난 아들과 함께라면???
[37] | 민트 | 2012.11.08 | 2455 |
| 58 |

|
[ 중국 사진 ] 쓸쓸함에 대하여.
[18] | 공간차이 | 2012.11.07 | 1985 |
| 57 |

|
2007년 신혼여행으로 다녀온 그리스 산토리니..
[27] | Jihong | 2012.11.06 | 3156 |
| 56 | 강남권 특급호텔 예약에 관한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12] | 민트 | 2012.11.05 | 2236 | |
| 55 |

|
[스위스] I believe I can fly
[20] | 공간차이 | 2012.11.05 | 18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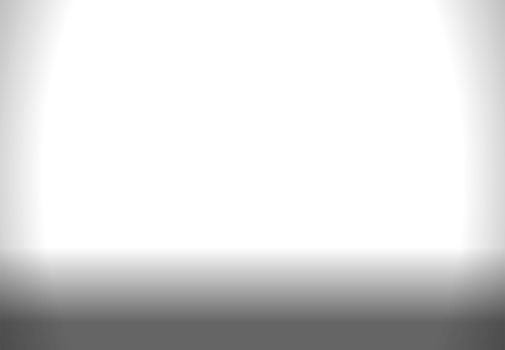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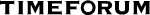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눈 내린 길을
처음 걸어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비어있을 때는
눈길위에 그려놓은 먼저간 발자국도
그 옆을 가르는 자전거자국 조차도 위안이 됩니다.